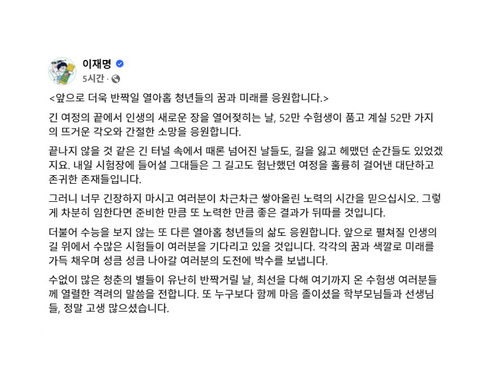이 영화의 감독이자 고등학교 3학년인 나(홍다예 감독)와 친구들의 처절한 학창 시절을 담았다.
고3이 된 홍 감독은 학교, 교실, 공원, 집 등에서 친구들과 함께, 혹은 혼자 일상을 기록한다.
학교 선생님이나 부모님은 수능에 필요하지도 않은 영화 촬영이 달갑지 않다.
친구들도 촬영이 불편했다는 걸 나중에야 알게 될 정도로 영화에 빠져있었다.
영화는 성적만이 자신의 정체성이라고 여겨지는 고등학생이 어떻게 생활하며, 어떤 고민을 하는지 영화를 통해 진솔한 속마음을 들을 수 있다.
획일화된 교육 시스템 속에서 꿈과 희망을 잃고 오로지 자신의 꿈이 수능이라는 청소년의 모습을 생생하게 담았다.
누구나 수능만을 위해 고등학교 3년을 소비하는 현재의 입시 제도가 잘못되었음을 알고 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선뜻 바꾸자고 나서기도 힘든 것이 현실이다.
공부를 못하면 열심히 안 했다는 생각이 들고, 대학이라는 목표를 이루지 못하면 잘하는 것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현실은 누가 봐도 잘못된 생각임을 알지만, 여전히 공부와 대학만이 가치로 여겨지는 사회에서 살고 있다.
대학 입시에 합격하지 못하면 사회 부적응자이며, 지금까지 했던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된다.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대학교에 가는 것이 모든 고민의 핵심이 된다.
일상생활도 모두 입시에 맞춰져 있는 공부하는 기계 같은 삶을 몇 년씩이나 반복하는 것이다.
특히, 제수를 하게 되면 상황은 더욱 안 좋아진다. 혼자 이 싸움을 더 해야 한다.
대학에 떨어진 내가 가치가 없는 것처럼 느끼거나 사람들이 만만하게 보는 것처럼 느껴져 더 힘들다.
영화는 이런 수험생의 심정을 날 것 그대로 보여주며, 한국의 입시 현장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다.
영화에서 이런 말을 한다. “대학을 못 가도 길은 있다”
전체의 인생을 볼 때 꼭 대학만이 정답은 아니다. 다양한 삶이 있고, 다양한 삶의 방식이 있다.
하지만, 대학을 갔다 왔느냐로 그 사람의 가치를 매기는 사회에서 대학을 포기하기란 쉽지 않다.
여전히 대학 진학이 성공의 척도로 여겨지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개인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의 과제로 남아있다.
대학 입시의 성공만이 행복의 지름길일까? 사실 우리 모두 답을 알고 있다.
/디컬쳐 박선영 기자 원본 기사 보기:디컬쳐 <저작권자 ⓒ 뉴스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많이 본 기사
|